
평양냉면이 상종가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서울에서 냉면좀 한다는 집치고 손님들로 미어터지지 않는 곳이 없다. 가격도 보통 1만원이 넘어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도 버거워졌다.
냉면은 겨울에 먹는 음식이지만 요즘에는 여름철 대표 음식이 됐다. 마니아들은 유명하다는 냉면집을 찾아 순례에 나서기도 한다. 어는 집은 육수를 소고기로 우렸고, 어떤 집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삶아 섞기도 하고, 동치미 국물도 넣는다며 품평회를 열기도 한다. 그만큼 냉면집들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 손님들을 끈다.
면발도 마찬가지다. 냉면의 주원료는 메밀인데, 어느 집은 100% 메밀로 면을 뽑는다고 자랑한다. 메밀은 열을 가하면 쉽게 끊어져 보통 메밀에 밀가루나 녹말 등을 섞는데도,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순면’을 고집한다.
먹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메밀의 고소함을 느껴야 한다며 식초나 겨자 등을 넣지 않고 오직 면과 국물만 먹는다. 당연히 백김치나 무절임도 안 먹는다. 냉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한마디로 남한에서 냉면은 실향민들의 소울 푸드(soul food)를 넘어 어느새 ‘성역화’되고 있다.
하지만 남한 사람에게 냉면의 성지(聖地)로 알려진 평양에서의 냉면은 하나의 맛있는 음식일 뿐이다. 뭐를 첨가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먹으라는 방법도 없다. 그냥 자신의 입맛에 맞게 먹으면 된다. 실제로 지난 7월4일 남북농구대회 참석차 방북한 남한 선수단과 대표단을 위해 옥류관에서 열린 만찬장에서 접대원들은 냉면과 함께 양념장을 제공하며 “기호에 따라 양념장을 적절하게 넣어서 먹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옥류관 냉면을 먹는 장면을 보고, 냉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옥류관의 냉면 면발이 칡색에 가까워 남한의 ‘아이보리 면발’과 다른 점에 놀라기도 했다. 육수도 남한은 맑은 색을 유지하기 위해 소금으로 간하는 것과 달리 간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옥류관 주방에서 냉면 만드는 법을 배워 탈북 후 ‘동무밥상’을 운영하고 있는 윤종철씨를 인터뷰했다. 그는 “식소다를 섞어 반죽하면 국수가 검어지지만 부드럽고 목 넘김이 좋습니다. 국물은 닭과 꿩으로 뽑은 육수에 동치미 국물을 섞고 간장으로 간합니다”라고 말했다. 메밀과 전분(감자녹말) 비율도 4대6으로, 남한 냉면집들보다 면발이 질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8년 9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을 맛봤다. 당시 먹었던 음식은 녹두전 등 몇 가지 코스였는데, 마지막에 평양냉면이 나왔다. 특징은 국물 양이 서울에서 먹던 냉면보다 적었고, 고춧가루도 적당히 들어가 색깔이 맑지 않다는 점이었다. ‘옥류관 냉면은 뭔가 서울과 다른 특별한 맛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여지없이 깨졌다. 서울에서 먹는 냉면보다 맛이 약간 세다는 정도로 기억된다. 시인 백석의 표현대로 이것이 ‘슴슴한’ 맛인지는 판단이 서지 않았다. 백석은 어머니의 손맛이 들어간 ‘엄마표 냉면’이었고, 기자가 맛본 냉면은 대중음식점인 ‘옥류관’ 냉면이었으니까.
특징적인 것은 배추김치였다. 남한의 배추김치에는 국물이 거의 없는데, 옥류관뿐 아니라 북한의 다른 식당에서 내놓는 배추김치는 여지없이 국물이 흥건한 ‘국물 김치’였다. 남한의 나박김치(백김치)와 비슷하지만 색깔과 맛은 배추김치였다.
흔히 최고의 음식을 ‘제철 음식’으로 꼽는다. 계절에 맞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요리해 먹어야 좋다는 뜻이리라.
국수도 마찬가지다. 본디 국수는 메밀로 만들었다. 메밀은 밀보다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 한반도 곳곳에서 구할 수 있는 구황식품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지방에서 국수 등으로 만들어 먹었다. 메밀은 면으로 만들면 잘 끊겨 녹말이나 밀가루를 첨가했다. 남한의 냉면집에서 고집하는 순면은 아니었다. 가정집에서 메밀국수를 만들 때 뚝뚝 끊기면 먹는 맛이 날까?
메밀가루를 빚어 김치를 넣어 비벼먹으면 막국수가 되고, 겨울철이 되면 사냥으로 잡은 꿩으로 육수를 내서 먹기도 했다. 서민들은 동치미에 메밀국수를 말아 먹었다. 냉면은 별미였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 조선시대보다 생활수준이 조금 나아지면서 소고기 육수를 사용하는 냉면이 등장했다.
남쪽 지방에서는 밀가루가 북쪽 지방보다 흔하다보니 멸치 등으로 육수를 낸 잔치 국수나 칼국수, 비빔국수를 해서 먹었다.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은 ‘평양냉면은 없다’고 단언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평양냉면이라는 냉면 스타일이 따로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전국의 여러 냉면 중에 평양에 있는 식당들의 것이 맛있다는 소문이었다. 해방과 함께 분단이 되며 남쪽의 사람들은 평양에 있는 식당에 갈 수 없게 되었다. 그 맛있다는 ‘평양 식당들의 냉면’을 못 먹게 된 것이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게 마련이다. 서울의 냉면 내는 식당들이 평양 마케팅에 돌입하였다. “이제 평양 못 가지요? 여기로 오시오. 우리 식당 냉면은 평양의 냉면 맛만 하오.” 이런 발상이다.
이제 ‘평양냉면 신화’를 벗어야 한다. 평양냉면은 범접할 수 없는 음식이 아닌 냉면집 저마다 고유의 레시피(recipe)로 만들어 내는 음식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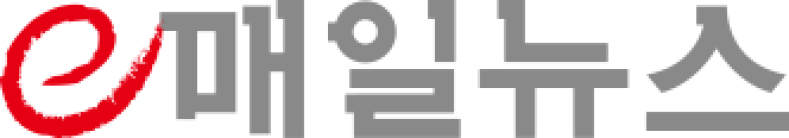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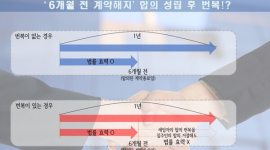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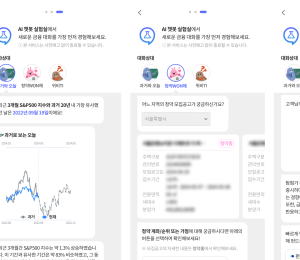




댓글
(0) 로그아웃